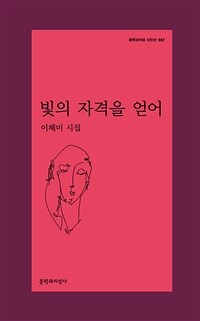
빛의 자격을 얻어
- 저자
- 이혜미 지음
-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 출판일
- 2021-08-23
- 등록일
- 2022-05-0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1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슬프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그곳에 살고 있었다”
빛의 자격으로 내 안의 진창을 비추는 이혜미의 홀로그래피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물의 세계, 그 속을 유영하며 물 무늬를 시로 새겨온 이혜미의 세번째 시집 『빛의 자격을 얻어』가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됐다. 『뜻밖의 바닐라』(문학과지성사, 2016) 이후 5년 만의 신간이다. 시인은 이전 시집에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일에 몰두하며 두 세계가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경계를 넘나들어 서로에게 흘러드는 사건에 주목했다. 이 책에서 이혜미의 시는 “더 이상 어떤 관계의 맥락 안에서가 아닌 홀로의 완전함을 지닌 것으로” 나아간다.
‘나’의 안에는 차마 입 밖으로 발화되지 못한 말들이 울창한 나무처럼 자라나 아프게 남아 있다. 너무나 길게 자란 내 안의 숲들을 화자는 더 이상 제 안에 두지 않기로 한다. 자신의 세계를 뒤흔들어 삼켜왔던 말의 가지들을 입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깨져버린 것들이 더 영롱하다는”(「홀로그래피」) 깨달음에서 온다.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 들어 빛과 조우할 때” 마주하는 것은 눈이 부실 만큼 반짝이는 이혜미의 시, “백지 위의 홀로그래피”(소유정)이다.
발화되지 못한 말들이 내 안에 숲을 이루고
내면으로 파고드는 여행을 시도하는 화자
나는 당신이 내버렸던 과실, 창백하게 타들어가던 달의 씨앗, 단단한 씨앗에 갇혀 맴돌던
[……]
가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아마도 먼 나라에서 훔쳐 온 것 말라가는 뿌리를 휘저어 당신에게서 멀어질 거야 희고 외로운 열매를 맺겠지 오래전 함께 스쳐 지나갔던 풀숲에서
나는 거꾸로 자라는 식물, 더러운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낯선 구석이 될 거야 우주의 품에서 조금씩 삭아가는 이 작고 얼룩진 행성처럼
―「로스트 볼」 부분
이 시집의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소유정은 발화하지 못하고 “그저 말을 삼”킴으로써 내부에 쌓인 말들을 ‘씨앗’이라고 말하며, 이혜미의 직전 시집 『뜻밖의 바닐라』에는 그 씨앗들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창백하게 타들어가던” 씨앗이었던 나는 이번 시집에서 “위독한 가지”(「겨울 가지처럼」)로 자라난다. “마음이 내쳐진 곳마다” 돋아나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잎사귀의 무늬로 떠오르던 상처”(「시간의 세 가지 형태」)처럼 가지를 뻗고, “희고 외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커가는 식물을 “거꾸로 자라는 식물” “거꾸로 서 있는 나무”(「머무는 물과 나무의 겨울」)라 칭한다. 이 뒤집힌 식물의 이미지는 수면 위에 비친 나무, 거울처럼 반사된 나무를 바라보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혜미의 시에서 그간 서로에게 스며드는 액체, 혹은 화자의 세계를 대변하는 사물로서의 액체가 얼마나 중요한 소재였는지 떠올리게 된다. “안으로 흘러들어/기어이”(「겨울 가지처럼」) 고인 물이 내 안에 온몸 가득한 멍으로 남아 있다. 나무가 뿌리 내린 “더러운 물속”, 그 물에 비친 나무는 화자의 아픔, 이는 내면의 병증이 반사된 모습이자 시적 화자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우주를 뒤집었을 때
말들이 쏟아지고 비로소 시작된 ‘나’의 이야기
심장을 보려 눈을 감았어. 부레의 안쪽이 피투성이 시선들로 차오를 때까지. 어항을 쓰고 눈물을 흘리면 롬곡, 뒤집힌 우주가 안으로 쏟아져 내렸어.
행성의 눈시울 아래로 투명하게 부푸는 물방울처럼, 빛을 질식하게 만드는 마음의 물주머니처럼. 흐르는 것이 흘리는 자를 헤매게 한다면 어떤 액체들은 숨은 길이 되어 낯선 지도를 그리겠지.
[……]
우주를 딛고 일어서는 힘으로
발끝이 둥, 떠올랐어
―「롬곡」 부분
내면에 비친 나무를 계속해서 응시하던 화자는 이제 “자신 안의 망령을 찾아 떠나는 여행 속의 여행”(「홀로그래피」)을 끝내기로 한다. 내 안에 갇힌 채 울창한 숲을 이뤘지만 나의 밖으로 발화되지 못한 나뭇가지들을 밖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수면에 비친 나무를 깨뜨리는 방법은 꽤 간단하다.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물 위에 반사된 것들은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혜미 시가 그간 중요하게 다뤄왔던 안팎을 뒤집는 행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수행된다. 화자는 과감하게 자신의 세계를 뒤집고 “뒤집힌 우주가” 흘러나오도록 한다. 이혜미의 시에서 이러한 전복이 그간 “타자와의 교감과 결합을 추구하는 시도”(오형엽)로 사용되었다면, 이번에는 ‘너’ 없이 ‘나’ 홀로 나의 세계를 뒤집어보는 행위로 나아간다.
그가 자리하고 있는 세계의 위아래를 바꾸고 안에만 머무르고 있던 말들, “고인 진창”이 나의 입 밖으로 흘러나온다. 고여 있던 물을 흐르게 하면 나는 눈물을 흘릴 만큼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액체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낯선 지도를” 그릴 것이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안의 것들이 새어 나온다. 마지막으로, “몸의 가장 어두운 뒷면” 나의 “닫힌 눈꺼풀”(「닫힌 문 너머에서」)을 뜬다. 빛의 자격을 얻은 화자의 시선은 “아직 흘러나오지 못한 말들을 비출 것이다. 눈이 부실 만큼 반짝이는 말들을 시인은 더 이상 삼키지 않고, 감추지 않고 내보일 것이다”(소유정). 관계 속에서가 아닌 홀로의 모습으로 우주를 딛고 둥, 떠오를 시간이다.

